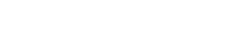- 6·25전쟁 통해 해병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
| 인천상륙작전 당시 적색해안에 상륙하는 우리 해병대. |
 |
| 한강 도강을 기다리는 대한민국 해병대원들(1950.9). |
● 김성은 제4대 해병대사령관의 시각으로 본 6·25전쟁
지휘관의 현장 판단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났던 6·25전쟁
전쟁 승패, 육전에서 판가름… 해병대 질적·양적 성장 계기
‘해병대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절박함으로 전투 치러…
■ 제주도에서 맞은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아침 이른 시간에 해군 본부에서 긴급전보가 왔다.
“새벽을 기해 전 전선에 걸쳐서 이북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다. 여태껏 있었던 일회적인 전투가 아니고 전 전선에 걸친 대규모 공격이다.”
이것이 전문의 내용이었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급박한 전황보고에 나는 군인으로서 마음의 준비와 앞으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가를 숙고했다.
미국의 즉각 개입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한반도는 미국 방어선에서 제외된다”는 미 국무장관 애치슨 선언이 겨우 5개월 전에 이루어졌는데, 한 국가의 대외공약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꿔질 수 있겠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전쟁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우리에게 들린 소식들은 38선이 무너진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곧바로 정부가 후퇴하면서 한강교를 폭파했다는 등 어두운 전황들뿐이었다.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를 흥분시킨 것은 맥아더 장군이 한국 전선을 돌아보고 서울탈환을 약속하며 도쿄로 돌아갔다는 소식이었다.
이어 희망찬 소식을 접했는데 그것은 UN 안보리에서 북한군을 침략군으로 규정, UN군 파병에 이어 미국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부대를 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 전쟁 통해 해병대는 질적·양적 성장
6·25전쟁은 해병대의 질적, 양적 성장의 큰 계기가 되었다.
해군의 상륙특수부대로 출발한 해병대는 ‘과연 얼마나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군 관계자의 생각이었다.
해병대 존속에 대한 의구심은 병력 TO(Table of Organization)부터였는데 6·25전쟁 무렵, 해군의 TO는 3,600명이었고, 그중 해병대가 1,200명이었다.
전쟁 직전 해병대는 1,166명으로 병력 TO가 거의 차 있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수 있다’라는 비유처럼 부대 육성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인원인데, 육성시키고 싶어도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는 도리가 없었다.
솔직히 신현준 사령관과 나는 해병대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를 고려할 정도로 해병대의 TO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6·25전쟁이 터진 것이다.
6·25전쟁으로 해병대는 질적,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했는데 전쟁의 무대는 하늘도 바다도 아닌 바로 육지였다.
전쟁의 승패는 육전에서 판가름났다.
하늘과 바다는 미국의 막강한 힘이 제압하고 있어 우리 공군이나 해군에게 맡겨진 전투 역할이 크지 않아 자연 병력 증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육지에서 싸워야 하는 해병대는 달랐다.
해군의 병력 증강이 멈춘 데 반해 육지에서 싸울 수 있는 해병대는 인원을 자꾸 증강했다.
그러면서 해군에서 많은 장교와 사병들이 해병대로 넘어와 모군인 해군보다 오히려 해병대의 몸집이 더 불어나 버렸다.
특히 해군의 묵호, 포항, 목포, 인천, 군산 기지사령부 등이 적에게 점령당하자, 그곳에 소속되었던 기지사령관과 사병들이 해병대로 많이 전과하였다.
그리하여 해병대는 전쟁으로 더욱 성장을 하게 된 것이다.
■ 지휘관의 현장 판단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나다
나는 일본군이나 만주군에서의 군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또 남보다 뛰어난 체력이나 지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나 역시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두려움에 떨었고, 치열한 적의 공격 앞에서는 여느 젊은이들과 똑같이 죽음이라는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다.
이렇듯 나 역시 평범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북한군의 전력에 밀리기만 했던 초기 전투에서도 해병대라는 소수 병력을 이끌고 그들과 싸워 승리했다.
무엇보다 아군 병력 손실을 거의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당시 해병대의 전투 장비나 전투 상황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4백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차량은 물론 무전기 등 아무런 통신수단이 없어 바로 옆에서 전개되는 전황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옆에 와 있는 부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누구의 통솔을 받아야 하며, 전투 시 어느 부대의 지원을 받고, 작전 지역이 어디까지며, 적의 동향은 어떤지 등 전투의 기본이라는 것조차 갖추지 못한 채 싸움에 임했기 때문이다.
또 전투의 기본이랄 수 있는 5만분의 1 작전지도도 없어 작전 지역 내의 읍, 면사무소, 파출소 등의 벽면에 붙어 있는 관내 지도들을 뜯어 작전용으로 사용해야 했다.
거기에 전쟁 초기에는 “무조건 나가라”는 일부 육군 지휘관들의 무모한 작전 지시 때문에 아무 정보도 없이 나가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지기도 했다.
그래서 ‘해병대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지휘관인 나의 책임 하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각오로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전쟁 전 보병학교 고등군사반과 육군 참모학교 지휘관반 교육은 당시에는 군 고위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 수준이었지만, 사실 그 교육은 실전에 와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교육 내용은 미국식 군사교육으로 견고한 군사 조직과 훌륭한 장비와 엄청난 물량 지원을 가정한 것이었지만, 내가 겪은 초기 전투 상황은 이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게릴라식으로 전투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6·25전쟁 초기 전투의 승패는 상황에 직면하여 지휘관이 내리는 순간적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임기응변적인 조치에 의해 판가름났다.
사령부나 지휘소와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에서 가장 중요한 실탄 보급조차 받을 수 없었고, 더욱이 피난 간 민가를 뒤져 허기를 채워야 했기에 모든 것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해병대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나는 타군으로부터 쌀 한 톨, 실탄 한 발 제때 지원 받지 못해 그 어느 부대보다 냉철한 판단으로 해병대를 지켜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강병 해병의 기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발췌 : 김성은 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